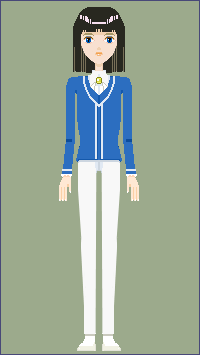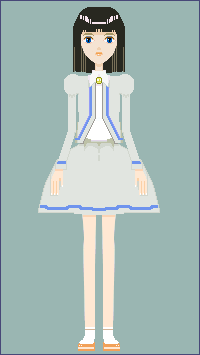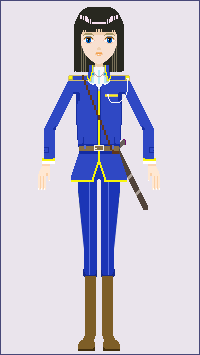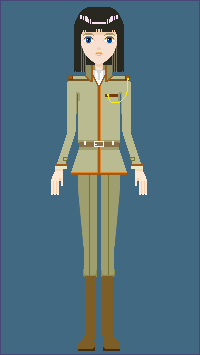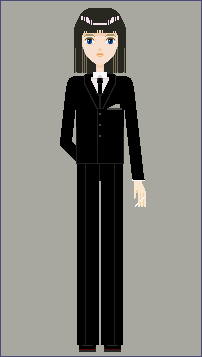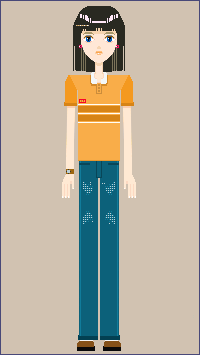※ 이 문어 대가리야. 오죽하면 껍질을 벗겨 김치통에 넣는 꿈을 꿨겠냐. 기분전환용 습작. ※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딘!』
신문을 읽는 척하다 슬그머니 엉덩이를 들고 우렁차게 가스를 뿜던 형은 동생의 타박에「내가 뭘?」이라며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입술을 뾰족하게 하고 한참을 노려봤음에도「자연스런 생리현상인데 시원하게 뀌면 그만이지 그걸 왜 참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더 웃긴 건 자기가 뿜어댄 독가스에 자기가 질식해선 손바닥으로 부지런히 부채질을 했다는 거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얄밉게도「악몽의 가스 덩어리」를 동생에게로 밀어버리는 시늉까지 했다.
『정도껏 해!』
코를 움켜쥐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더니 그제야 무천 도사의 에네르기파 동작을 그만둔 딘은 읽던 신문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도 있었다.
『어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라도 뭐 있어?』
『어... 음.』
방금 샤워를 끝마치고 나온 샘이 무릎이 닿도록 가까이 앉자 딘은 불편한 안색을 했다.
왜? 라는 의미로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자 신랄한 지적이 돌아왔다.
『젖은 몸으로 나에게 기대지 마. 형의 옷이 축축해지잖아.』
샘은 얼른 형에게서 몸을 떼어내고 미안하다 사과했다. 그러나「잘못했다」고 말하는 입과는 다르게 그가 왜 자신의 허벅지로 손을 올리는 않는지를 열심히 생각했다. 아마도 딘은 샘에게서 아무런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쭈삣거리는 동생에게서 약간만 거리를 벌린 딘은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신문의 다음 장을 넘겼다.
『악마들이 요즘 휴가를 갔나 보다. 대신 외계인이 좀 바쁘신 것 같어.』
샘은 침 묻은 손가락이 자신의 입술 안으로 당당하게 침범하는 걸 상상했다. 입안을 훑고, 잇몸을 더듬고, 혀를 쓰다듬고...
『외계인?』
『미세스 데커리가 자기 집 뒷마당을 부지런히 파고 있는 외계인을 목격했단다.』
『흐음, 개의 유전자를 가진 외계인인가.』
『그게 아니라 미세스 데커리의 뇌로 흥분제가 잔뜩 발린 개의 털이 들어간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딘은 그놈의 망할 개털이 샘의 콧속을 침범한 건 아닐까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동생의 얼굴은 온통 붉었고, 빠르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식으로 얕은 숨을 빠르게 뱉고 있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면 흥분한 것도 같았는데「땅을 파는 외계인」이 샘의 취향이 아닌 이상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게 문제였다.
『샘. 너, 괜찮니?』
『괜찮고말고.』
재빨리 표정을 바꾼 샘은 딘의 어깨를 툭 치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흩어진 뼈를 모아, 살을 붙여, 소거되었던 생기를 복구시킨다.
하느님의 숨결, 재차 불어넣어진 신의 호흡.
작은 티끌로부터 온전한 인간을 일으켜 세운 천사는 찢어지고 베인 흉터를 생략했다. 부러진 곳이 잘못되어 휘어졌던 손가락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동생과 살을 맞대고 같이 잤다는 과거 역시 지웠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밤과, 낮과, 그리고 기억들은 그들의 판단으로는 되돌릴 가치가 없는 거였다. 손가락을 고친 것처럼 천사는 굴곡진 기억도 망치로 두드려 평평하게 폈다. 그리하여 옷을 벗은 동생을 쳐다보는 딘의 시선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제발 샤워하고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 뭐라도 입고 있어. 날 피 말려 죽일 셈이냐. 너만 보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 제기랄, 젖은 머리카락으로 무방비한 표정은 짓지 마. 도저히 못 참겠네. 이리와. 당장 해야겠어.
참을성이라곤 요만큼도 없는 짐승처럼 군다고 흉보던 시절도 있었다.
샘은 눈두덩이를 누르며 실소했다.
『샘?』
최근들어 그의 동생은 하루 권장량의 네 배의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처럼 굴었다. 살짝 돌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혼자서 킬킬거리며 웃다가 급격히 우울해했고, 등을 구부린 채 느리게 움직이다 갑자기 미친 생쥐처럼 돌아다니기도 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요즘의 샘은 그 증세가 병적이었다.
뭐, 갈기갈기 찢김을 당해 죽었던 사람이 4개월만에 지옥에서 되돌아와「이 형, 멋지지 않냐?」이랬으니 당연한 반응인 것도 같지만... 할 말이 있다는 시선으로 쳐다보다가 입술을 지긋이 깨물고 고개를 돌리는 건 나름 짜증스러웠다. 생략된 질문이「당신, 정말로 내 형이야?」인 것 같아서,「이 모든게 악마의 속임수인 건 아니야?」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 순은의 나이프로 피부를 갈라 흐르는 피를 보여주고, 성수를 마시고, 후추 가루에 반응하여 삼세번 재채기를 해보였어도 저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의심은 해소되지 않은 듯했다.
「명색이 헌터인데 의심 한 번 안 하고 넙죽 믿어줬어도 문제지만 말이지...」
샘의 태도를 칭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욕할 수도 없는 딘은 속이 답답할 뿐이었다.
이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현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으리라.
허공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딘은 동생을 향해 어색하게 웃다가 그렇게 눈치를 볼 까닭이 없음을 깨닫고 도로 웃음을 거뒀다.
샘은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다가왔다.
자, 그래... 동생아. 나는 네 형인 딘 윈체스터다. 도대체 무엇을 더 납득시켜야 하니.
동생은 주먹을 쥐었고, 1, 2초 정도 주춤거렸다.
결국엔 눈을 질끈 감더니 잘 익은 수박을 골라낼 때처럼 딘의 머리를 세 번 두둘겼다.
『야! 지금 이게 뭔 짓이야~!!』
『안돼. 역시 이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겠어.』
『확인하다니. 뭘!』
『중요한 거야. 어둠 속에서도 반짝거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고, 딘.』
『뭐?』
『찾을 수 있을까?』
화낼 기운도 없다. 솔직히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
다만 중요한게 사라졌다고 하니 찾을 뿐이다.
신문을 반으로 접어 테이블에 올려놓은 딘은 그 즉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손바닥으로 카펫을 세심하게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긴 거야, 없어졌다는 거... 얌마, 그렇게 쳐다보지만 말고 뭐라고 말을 해. 주둥이에 풀 발렸냐. 말을 하라니까... 샘?』
Posted by 미야